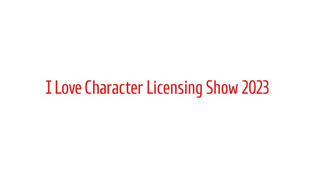마치 뛰어난 수준의 아이를 둔 부모가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는 걸 칭찬하고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상상하는 대상으로 착각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유로 실망하고 꾸짖는 것과 같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아이는 이로 인해 트라우마에 갇힐 수 있고 더 큰 성장의 가능성을 닫은 채 스스로 벽장 안으로 숨어들지도 모른다.
웹툰산업 역시 놀라운 성장과 성과는 인정하되 아직 성장 진행형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제아무리 잘난 아이라도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아직 서툴거나 배워야 할 게 있다면 격려하고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지켜봐야 할 일이다.
섣불리 매를 들거나 꾸짖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매를 맞거나 질타를 들어야 할 대상으로 늘 거론되는 게 웹툰산업, 그리고 기업이다.
웹툰을 구성하는 작가, 독자, 기업의 관계는 동행이다. 동행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상생이다. 동행과 상생의 관계와 구조 안에서 갑과 을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가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인정해야 할 이유도 없다.
위험한 불균형, 젠가게임 멈추기
산업이 성장하면 여러 목적과 이해관계들이 발생한다.
산업은 순수한 애정과 진심을 에너지 삼아 열정을 불태우며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와 그들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애정을 전하는 독자, 언제나 그렇듯 그들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며 객석을 마련하고 무대를 준비하는 웹툰기업이 이끌어 간다. 웹툰기업이 비추는 조명은 어제처럼 오늘도 여전히 자신들이 아닌 객석과 무대로 향한다. 그것은 웹툰산업이 존재하는 한 내일도 변함없으리라.
이처럼 웹툰에 대한 무한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 산업을 키워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무리에 섞여 단물에만 눈독 들이는 이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자신의 본질을 감춘 채 “웹툰을 위해, 웹툰산업을 위해” 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잣대를 들이밀며 정의와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문제는 그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방향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은 스스로 웹툰을 위하고 웹툰의 길을 걷는 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언어와 행동에서는 딱히 웹툰을 선택한 운명적인 이유나 목적, 사명감은 찾아볼 수 없다.
웹툰산업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한 그들은 웹툰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틈에 섞여 있겠지만 쇠퇴하거나 더 이상의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면 지체없이 떠날 것이다.
그들의 행태는 언제나 비슷하게 나타난다. 작가와 독자, 기업이 서로 어우러져 동행과 상생을 위해 노력할 때, 이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언제나 갈등을 야기한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 부각시키고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을 오해로 변질시켜 항상 대립 관계를 유도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은 갈등이 있어야 역할이 생기고 대립해야 비로서 자신들이 부각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상적인 상생의 환경에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균형이 무너지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
젠가게임의 규칙과 목적은 명확하다. 플레이어는 필요한 블록을 꺼내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 세삼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것이 오래 유지될수록 서로가 즐기는 하나의 게임이 된다.
웹툰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인 작가, 독자, 기업은 각자의 방식으로 웹툰산업이라는 블록을 쌓아간다. 균형이 유지되고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보다 견고한 형태로 블록을 쌓아 균형 있게 높은 탑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이들은 이익이 된다고 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탐나는 블록을 빼내려고 한다.
이제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멈춰야 할 때다. 지금은 블록을 빼낼 때가 아니라 채워야 할 때다. 빈틈을 메우고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 시기이므로 갈등과 대립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서범강
· (사)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 아이나무툰 대표
[ⓒ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