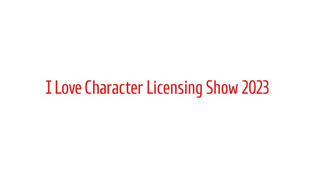사례
응용미술작품은 공산품 등 물품에 미술이 응용된 것으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에 이용된 응용미술이 디자인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춘다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디자인이 보호를 받는 건 아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디자인 등록이 돼야 하며,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바로 그것이다.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성립에 있어 아무런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달리 디자인권은 위와 같은 등록 요건이 필요해 보호 범위에 포섭되기 어렵고 보호기간도 디자인 등록 출원일 후 20년에 불과해 저작자 사후 70년이라는 저작권법에 비하면 매우 짧아 보호가 유지되는 것 또한 어렵다. 그래서 응용미술작품의 보호에 있어 디자인보호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해설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도입됐다. 개정 전 저작권법하에서 대법원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에 소극적이었다. 대법원은 대한방직이 직물 도안을 무단 복제한 혐의로 피소돼 직물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에서,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대량생산 이용을 목적으로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해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으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 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량생산 이용을 목적으로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수 없고, 그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해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 도안이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요컨대 응용미술작품의 경우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될 경우 등록 요건 등 디자인보호법(옛의장법)에서 규정한 여러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대량생산 이용을 목적으로 창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도안이나 모델 자체가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돼 식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녔다면 예외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4. 11. 10. 선고 94노 2571 판결 참조).
대법원의 이 같은 태도는 서체 도안과 생활한복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건에서도 이어졌다. 서체 도안 사건(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에서는“우리 저작권법은 서체 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인쇄용 서체 도안처럼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으로서의 서체 도안은 거기에 미적 요소가 가미돼 있다 해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했다. 생활한복 사건(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1의2호에 따르면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돼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대한방직 사건의 원심 판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요건 중‘도안이나 모델 자체가 그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돼 식별할 수 있는’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 이후 대법원은 히딩크 넥타이 사건(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에서“옛 저작권법과 달리 개정된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춰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민족 전래의 태극 문양 및 팔괘 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고 물품과 구분돼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돼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며, 기존에 요구하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녀 예술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할 것의 요건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됐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서적 표지 디자인 사건(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에서“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해‘디자인을 포함해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돼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려면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 가능성이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서적 표지에 대해 표지·제호 디자인은 모두 이 사건 초판 4종 서적의 내용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서적 표지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요컨대 개정된 현행법하에서는 ①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복제 가능성)과 ②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돼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 것(분리 가능성)의 두 요건을 갖추면 응용미술작품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는 디자인보호법과 중첩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이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해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분리 가능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디자인 등록이 돼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된다. 응용미술작품이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상의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됐다면 역시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예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홈페이지: https://dkl.partners
·전화: 02-6952-2652
·이메일: yehee.lee@dkl.partners
아이러브캐릭터 / 이예희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