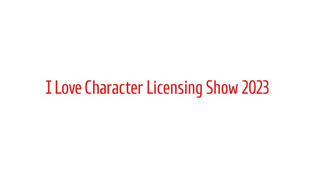사례
A는 3D 캐릭터 제작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하는 회사로 3D 캐릭터의 구조 설계, 디자인 등의 업무가 필요한 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X의 저작권자다. A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B가 프로그램 X를 무단 복제해 프로그램 Y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주장했다. 이때 A는 B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할까?
해설
컴퓨터 프로그램과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해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하고 있다(저작권법제2조 제16호).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를 의미하는 프로그램 언어, 특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을 의미하는 규약,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 방법을 의미하는 해법에 대해선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위와 같은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의 경우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사례의 경우 A가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 X는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외에 프로그램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해야 저작권이 인정된다.
복제권 침해 주장과 판단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 즉 B가 만든 프로그램 Y가 프로그램 X에 의거해 작성됐고, 프로그램 X와 프로그램 Y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이때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갖고 대비하는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한 저작물이므로 두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 X를 복제, 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먼저 프로그램 X의 구성 요소 중 창작성 있는 부분을 가린 다음, 그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프로그램 Y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을 비교해 프로그램 X와 프로그램 Y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B가 프로그램 X에 의거해 프로그램 X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복제해 프로그램 Y를 창작했음을 전제로 다음 쟁점을 판단해보자.
추가적 사실관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B는 이후 본인의 영업권을 출자해 기존의 사업장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그 업종 역시 완전히 같은 법인 C를 설립했다. B는 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개인사업체에서 사용하던 직원을 그대로 입사시켰으며 C를 설립한 직후 개인사업체를 폐업했다.
A는 B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최종 확정됐다. 이때 B와 별개의 법인 C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을까.(추가적 사실관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5194781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 판결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것임을 밝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본 칼럼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린다.)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그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같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럴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됐다면 그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됐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회사에 대해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위 사례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5194781 판결에서는 B의 개인사업체와 회사 C의 업종이 완전히 같은 점, B가 본인의 영업권을 회사 C에 출자한 점,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던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외에도 나머지 직원 또한 그대로 입사한 점, C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B의 개인사업체 사업장 소재지와 같고 현재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체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심지어 상호까지도 같은 회사 C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됐다.
또 회사 C의 대표이사 B가 특별히 다른 주주의 존재나 주식 비율을 주장하지 않는 등 B가 회사 C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이를 전부 행사할 수 있는 등으로 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있다면, A가 B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 회사 C에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참작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회사 C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짐에도 그 법인격이 부인돼 A는 B뿐 아니라 회사 C에 대해서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예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홈페이지: https://dkl.partners
●전화: 02-6952-2652
●이메일: yehee.lee@dkl.partners
아이러브캐릭터 / 이예희 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