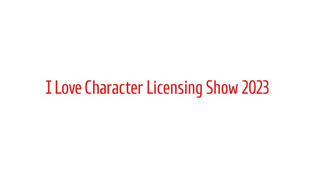사례
애니메이션 X를 제작한 A는 X라는 제호를 창작했다. B는 Y라는 명칭의 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X라는 제호와, 애니메이션 X에 나온 대사를 이용해 Y 식품을 홍보했다.
이에 A는 “Y 식품 광고에 X 제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B는 “X라는 제호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X라는 제호와 애니메이션 X에 나온 대사는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
해설
제호와 저작권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 같은 기준에서 판례는 만화 제목 ‘또복이’에 대해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고 봤고, 무용극 제목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에 대해서도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고 판결해 기본적으로 제호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서 재밌는 판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아이돌 가수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노래 제목을 만든 신청인이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명칭의 라면을 생산, 판매한 피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 정지 신청을 한 사안이다.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 바, 음악저작물인 대중가요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대법원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대법원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참조), 이 사건 제호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설령 현대 사회에서 제호가 갖는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제호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제호 중 창작적 사상 또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을 선별해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해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이 사건 가요에 이 사건 제호와 동일한 가사가 반복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호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며 이 사건 제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사, 짧은 글귀와 저작권
서울고법은 희곡 ‘키스’ 의 작가인 원고가 영화 ‘왕의 남자’ 제작사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는 창작성이 없는 흔한 표현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사는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소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詩) 등 다른 작품에서도 이 사건 대사와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있 다” 는 점을 주요 논거로 제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06. 11. 14.자 2006라503 결정). 유사한 표현이 많고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어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짧은 글귀의 창작성이 인정돼 그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인디 밴드 가수가 발매한 앨범1984 청춘집중의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백화점이 상품 판매 공간에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게시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어문 저작물의 경우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 방식에 창작, 궁리를 할 여지가 없는 경우나 아이디어와 일체로 된 표현이나 표현 형식이 제약돼있는 표현 및 단순히 사실을 소개한 것으로 다른 표현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체적인 표현이 평범하고 매우 흔한경 우에는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 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용어의 선택, 전체 구성의 궁리, 특징적인 표현이 들어 있는 가 하는 그 작품의 표현 형식과 그 작품이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 목적 및 그에 따르는 표현상의 제약 유무와 정도, 그 표현 방법이 같은 내용과 목적을 기술하기 위해 일반적,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고 판단했다.
판례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제호의 경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겨 있기 어려울 것이므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짧은 글귀의 경우에도 용어의 선택, 표현 형식과 내용 등을 고려해 창작성을 인정하므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안의 해설
따라서 기본적으로 X라는 제호와 애니메이션X에 나타난 대사가 짧고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겨있는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X의 제호 및 대사와 관련해 용어의 선택, 표현 형식과 내용등을 고려했을 때 창작성을 인정받는다면 저작권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저작권과 별개로 X라는 제호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됐다면 상표법 위반, X라는 제호가 널리 알려진 경우 이에 대한 신용과 명성 등 경제력에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예희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홈페이지: https://dkl.partners
· 전화: 02-6952-2652
· 이메일: yehee.lee@dkl.partners
[ⓒ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