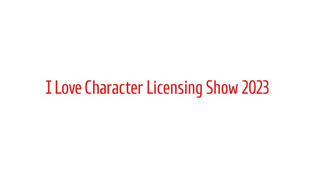사례
A는 애니메이션 X를 제작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애니메이션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A는 애니메이션 일부를 수정해 발표하고자 했고, 제작사 측이 B도 제작자로 추가하자고 하자 이를 승낙했다. B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A의 애니메이션은 A와 B 공동 제작자로 수정 표기해 발표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 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미 공표된 애니메이션을 저작자 A의 동의를 받고 공표했음에도 B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할까? 그리고 저작자 A 또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
(본 사례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및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 판결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칼럼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린다.)
해설
저작권법의 규정 및 문제점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이때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원저작자의 동의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위 사례에서는 원저작자 A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점(저작권법 제140조 제2호 참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라며 원심의 입장을 유지했다.
애니메이션을 다시 발표한 행위가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위 사례의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의 1심 판결은 “공표권은 어디까지나 미공표 상태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최초의 행사에 의해 공표권은 소멸하고 저작자가 다시 공표권을 주장할 순 없다. 한번 공중에 공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은 이미 공표가 된 것이어서 더 이상 그 저작물에 대해선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미 발행됐던 서적의 일부 오탈자만 수정해 다시 발행했으므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고단4772 판결 참조).
그러나 2심에서는 저작권법의 개정 경위를 살펴볼 때 발행 행위가 아닌 공표 행위를 처벌하려 한 것에 비춰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참조).
대법원도 2심의 입장을 유지해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요컨대 원저작자 A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B의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애니메이션이 비록 이전에 발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표 행위가 있었던 이상 B의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대법원(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에 의하면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원저작자인 A 또한 동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춰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예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홈페이지: https://dkl.partners
·전화: 02-6952-2652
·이메일: yehee.lee@dkl.partners
[ⓒ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